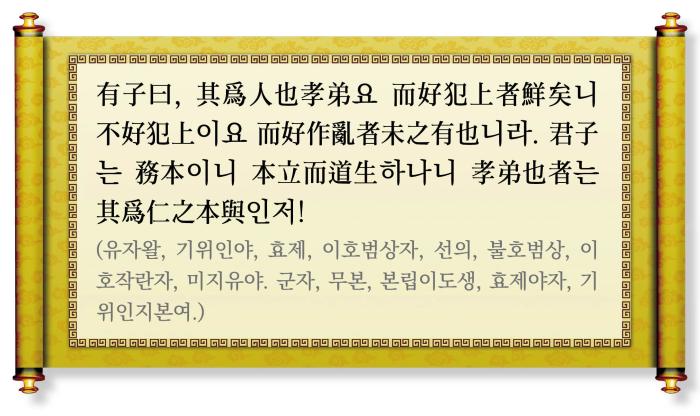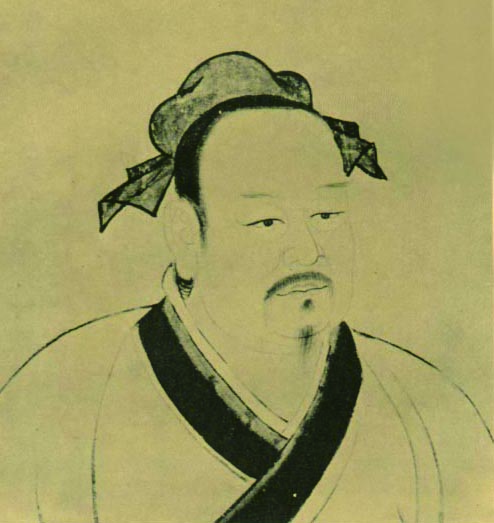유자께서 말씀하셨다.“그 사람 됨됨이가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도 윗사람을 능멸하는 사람은 드물고,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으면서도 쉽사리 난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군자는 모름지기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고 나서야 인(仁)이라는 도가 그 바탕 위에 생길 것이니, 효제야말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리라!”
有子曰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其爲人也孝弟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도 而好犯上者鮮矣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무니, 不好犯上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서도 而好作亂者未之有也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다. 君子 군자는 務本 근본에 힘쓰니, 本立而道生 근본이 서고 나서야 도가 생기나니, 孝弟也者 효제라는 것은 其爲仁之本與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이겠지!”
▶해설
○有子: 공자의 제자. 노(魯)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약(若), 자는 자유(子有). 『논어』에서 공자의 문인들은 주로 이름이나 자(字)로 불려졌으나 증삼(曾參)·유약(有若)·염구(冉求)·민손(閔損)은 각각 증자·유자·염자·민자로 경칭되고 있다. 이는 훗날 『논어』가 증삼과 유약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정자(程子)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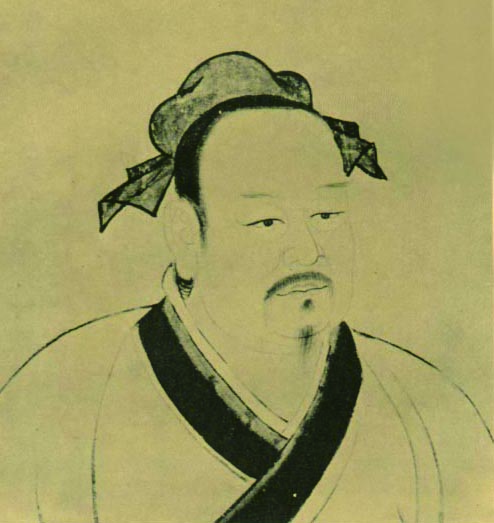 |
| 유약 |
○其爲人也孝弟: 그의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다
△其: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사. △爲: 동사로 ‘되다’. △也: 음절과 어조를 조절하는 어기조사. △弟: 형용사로 ‘공손하다’. ‘悌’와 같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을 ‘孝’라 하고, 형이나 연장자를 잘 받드는 것을 ‘弟’라 한다.
○而好犯上者鮮矣: 그러하면서도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而: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好: 동사로서 ‘좋아하다’라는 뜻. ‘좋다’라는 형용사(形容詞)가 의동사(意動詞)로 전용된 것. △矣: 필연의 결과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者: 앞말의 수식을 받아 전체를 명사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특수대사. ‘~하는 사람’.
○未之有也: 아직 그것이 있지 아니하다, 아직 없었다
‘未有之也’의 도치형. 부정문의 ‘동사+목적어’ 구문에서 목적어가 대사인 경우 그 대사는 동사 앞으로 도치시킨다.
△未: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아직 ~하지 아니하다’의 뜻. △也: 판단 또는 진술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孝弟也者: 효제라고 하는 것
△也者: 음절과 어조를 조절하는 어기조사. 也, 者 두 개의 어기조사를 연용한 형태. 일반적으로 ‘~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其~與: 아마도 ~이겠지!
△其: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 △與: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